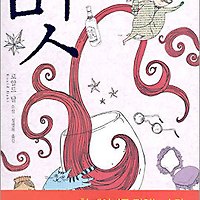영하 17도를 가르키는 온도계와 시계를 번갈아 보며 긴 숨을 내쉰다.
입 밖으로 퍼지는 차가운 입김은 마치 1996년 5월 10일 실제 책 속의 주인공들이 목표로 삼았던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의 추운 날씨와 폭풍 속에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을 떠오르게 한다.
내가 바로 그 장소에 있기나 한 것 처럼 생생하게 서술된 절정의 장면들은 따뜻한 아랫목이나 뜨거운 태양 아래의 해변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숨막히는 전율과 긴장감을 제공한다.
우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며 자신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두어 발을 내딛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전진하는 그들과 달리 나는 무섭게 빠져드는 텍스트에 스스로를 진정시키고자 장갑을 낀 채 손에 쥔 책을 잠시 접고 다시금 깊은 숨을 내쉬어 본다.
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내려 가고자 했던 곳에 비하면 이 곳은 낙원이겠지...
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 절박한 그 순간을 등장인물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꽤나 안심이 되었던 것은 어렴풋한 추억 속에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결코 일어 날 수 없는 일을 꾸며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절정의 순간 앞에서 스스로를 위안했던 것 과는 분명히 다르다.
제 시각에 맞춰 도착하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불만과 추위 그리고 책이 전해주는 서스팬션으로 유난히 경직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 같지만 산을 오르지 않고도 잠시나마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.
책은 무엇을 읽을 것인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"언제", "어디서"가 주는 재미도 무시 할 것이 안되는 것 같다.
산악인의 필독서라지만 나는 등산을 하지 않는다.(싫어 해서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딱히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...)
팟캐스트를 통해 소개된 이 책의 짤막한 서문을 들으면서 깊은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작가(존 크라카우어)의 비장함이 절제된 문장사이로 느껴져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.
빈 수레가 요란한 그런 류의 베스트셀러에서 보기 힘든 그 무언가를 말이다. 한마디로 산을 좋아하지 않아도 읽을만한 책이다.
"각종의 편의 시설의 안락함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된 우리 문화의 해독제"로서 특별한 모험을 감행 할 생각이 없다면
유난히 추운 겨울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책이다. 따스하고 아늑한 공간을 피해서 말이다.